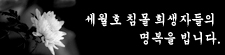글 | 길날 농사짓는 사람
디디는 그녀, ‘등대아이’의 약칭이다. 등대아이는 시를 쓴다. 시 쓰는 등대아이, 그녀가 말했다. 자신에게 유일하고 중요한 바람이 있다면 계속 걷는 것이라고.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 사는 게 괜찮다고. 올해 서른 살이 된 그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2년을 채우던 지난 4월에 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다. 주 5일, 오후 4시간 근무라는 패턴은 변한 게 없다. 총 58만 원가량 되는 임금 가운데 4대 보험 관련해서 공제하고 받는 54만 원가량의 월급도 똑같다. 정규직이 되긴 했으나 달라진 게 있다면 계약 해지의 불안감으로부터 놓여났다는 것 정도다. 구인 구직 웹 사이트를 보고 찾아가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디디의 일터는 노인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일을 하는 부산의 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곳으로 오후 1시경에 출근하여 4시간을 일하고 5시경에 퇴근한다. 간단한 문서 작성 말고는 크게 주어지는 일이 없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따른 사업체의 ‘필요’에 의해 (지나치게 말하면) 자리만 마련해 앉혀 놓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지금도 일의 양이나 내용에 있어서 별반 달라진 건 없다. 하지만 이런 느슨한 근무 형태와 친밀감 없이 이뤄지는 그곳 비장애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맺기에 그럭저럭 적응을 했다.
뇌병변 2급 장애인인 디디의 어릴 적 별명은 ‘울보’였다.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언어 치료를 받으러 다니느라 힘들고 분주했다. 거의 매일 울면서 다녔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러서야 눈물을 그쳤다. 주변의 ‘보통’ 아이들과 달리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어린 마음에도 태어난 일 자체가 서럽게 와 닿았던 것이다. 중학교 갈 무렵까지도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신체로부터 촉발되는 삶을 견디기 힘들어 했던 것 같단다.
일반 학교에 다녔다. ‘왕따’를 당하면서 혼자 노는 법에 익숙해졌다. 더 어렸을 적, 그림을 그리고 조몰락거리며 찰흙으로 무언가를 빚고 종이접기 놀이를 하며 그랬던 것처럼 책을 읽으며 세상의 시간에 적응해갔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 막연히 ‘글을 쓰며 살고 싶다’고 느꼈다. 책과 글을 통해 받는 위안과, 발견의 기쁨과 즐거움이란 게 무엇인지 알 것도 같았다. 문예창작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대개는 집에 있었다. 종일 책 읽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글 쓰며 사는 삶이 좋긴 했으나, 경제적 자립의 필요와 더 적극적인 사회적 소통의 욕구가 생겨나지 않을 리 없었다. 용기를 내어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밀고 몇몇 지인에게 어렵게 말을 건네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현재의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 졸업 후 4년 만의 일이었다. 지금은 일을 하면서 일정한 돈을 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전히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하고 운동도 한다.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산행, 국토순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행하기···. 해보고 싶은 게 참 많다. 참 많은데, 못하니 ‘화병’이 날 정도다. 살아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일궈가고 싶은 건강한 욕구의 발현일 것이다.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어찌 두껍고 집요한 안개 같은 두려움이 그녀의 안팎을 떠돌며 발목을 붙들지 않았겠는가. 그때마다 의지에 의지해온 삶이다. 디디는 자신을 구성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할 수 있다”일 것이라고 했다. 두려움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올 때 속으로 수없이 이 말을 외치면 용기가 불쑥 돋아난다고 했다. ‘의지’가 빠진 삶은 자신에게 무엇도 아니라며.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느리고 ‘어눌’하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낯설고 끈질긴 눈길 앞에서도 이제는 좀체 숨지 않는다. 가능한 한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한다. 아니 ‘그냥’ 사는 것일 뿐인데, 용기를 내야 했던 집 밖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살아오고 있다. 덕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현재가 이제까지의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그야말로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걸을 수 있어서’ 사는 게 괜찮다고, 살 만하다고 느낀다. 새로운 혹은 새로 난 길을 따라서 한 발 두 발 디뎌온 서른 고개. 누구나 그런 것처럼 존재감과 자존감을 향해 걸어온 생이었을 것이다. 디디가 걸어가는 그만큼 그것들이 그녀 속으로 걸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세상과 사람들 속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지금만큼의 속도로 걸음이 죽 이어질 수 있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일 것이다.
쓴다는 행위 또한 계속해서 걸으려는 의지와 발맞추지 않았다면 이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써야(만) 한다는 의지를 실어 꾸준히 써왔으므로 또 살고 있다고 느낀다. 걷기만큼이나 그녀에게 중요한 시는, 글은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된다. 그동안 시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써왔다. 신춘문예며 각종 문예지의 시 부문에도 수년째 응모 중이다. 시를 쓰면서 생겨나는 감정들은 그때그때 다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요즘 들어 유독 예전과 다름을 느낀다. 어떻게 다르다고 콕 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른바 시 쓰기의 ‘과도기’를 지나치는 중이라 여기고 있다. 이 경계의 시기를 잘 벼려가다 보면 시들에 그녀 자신만의 오롯한 색깔과 목소리를 담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 미더운 의지의 낙관이 날개를 달아 떠오른 영감이 머지않은 날에 이 시, 저 시로 활짝 피어나기를.
한 존재를 마주할 때 그 대상이 갖는 ‘아우라’라는 게 있게 마련이라면 시 쓰는 그녀, 디디에게서 뛰쳐나와 말을 거는 기운이랄까 분위기는 (불필요한) 잉여가 빠진 영혼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 모습의 표정이 그렇다. 군살이 없는 영혼이란 게 있다면 저런 얼굴과 몸을 입고 있을 거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울고 걷고 쓰면서 지금에 이른 그녀, 디디. 조곤조곤 조심조심 자신을 들려준 그녀가 고맙다.
길날_전라남도 장흥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