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오진호 센터 기획편집부장
‘생계’를 위한 첫 노동
누구에게나 첫 노동은 있다. 그리고 첫 노동의 기억은 꽤 오랜 시간 남는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잊고 싶은 기억이든. 별다른 고생 없이 대학을 다니던 나에게도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2003년 겨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가 막막해지면서다. 세 달이 채 안 되는 겨울방학 동안 최소한 다음 학기 등록금은 벌어놔야 했기에 나는 이리저리 일을 찾았고, 때 마침 오픈한지 얼마 안 된 대형마트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내가 했던 일은 마트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장을 보는데 있어 필수 아이템인 카트는 매장 입구에 들어갈 때 언제나 옆에 정돈되어 있다가 역할을 다하면 곳곳으로 흩어진다. 어떤 카트는 주차장 구석에 박혀 있기도 하고, 마트 바깥 어딘가에 널브러져 있기도 하다. 화장실 옆에 서 있는 카트도 있고, 매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트 주차대에 모여 있는 카트도 있다. 내가 했던 일은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카트를 모으고, 그 카트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카트 안에 남아있는 전단지, 시식용 이쑤시개,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청소하고, 카트를 모아 매장 옆 보관대로 운반하는 것이 내가 했던 일이었다.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가끔 주차장에서 카트 위에 올라타 달려보기도 하고, 손님이 챙겨가지 않은 카트 보증금 100원을 빼서 자판기 커피를 사먹기도 했다. 곳곳에 돌아다니는 카트 2~30개가 모이면 한꺼번에 매장으로 나른다. 길게 늘어진 카트는 뱀처럼 꼬불꼬불 움직이고, 노동자는 카트 옆에 바짝 붙어 카트가 도망가지 않도록 잡는다. 고객들이 카트를 운전하는 우리를 구경거리 보듯 지켜보면 왠지 신이 나서 더 많은 카트를 옮기는 위험한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만남, 그리고 인연
당시 휴게실은 주차장 구석에 있었다. 5평 남짓한 사무실은 주차, 카트, 보안 업무를 하는 노동자 20여 명이 함께 쓰는 휴게실이었다. 세 분야는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외주화되어 있 었고, 이 업체 사무실이 우리가 쉬는 휴게공간이었다. 사무실에는 업체 관리자 1~2명이 상주했고, ‘김 과장’, ‘이 대리’ 등으로 불렸던 이들은 농담도 던지고, 회식도 자주 하면서 나름 인간미 있게 우리를 대우해줬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하는 노동은 즐겁지 않았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가 먹을 밥상까지 차려놓고 나가야 했고, 일이 끝나면 곧이어 과외를 해야 했기에 몸은 항상 피곤했다.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돌아가셨기에 세상 앞에 던져진 기분이었고, 항상 머릿속에는 안 좋은 생각들이 가득해 안절부절못했다.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등록금을 모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고, 빡빡한 일상에 여유는 찾아 볼 수도 없었다. 저녁마다 술자리를 갖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동료들이 이유 없이 밉기도 했다.
그나마 내가 마음을 열고 있을 수 있던 시간은 업체 관리자인 ‘김 과장님’과 있을 때였다. 40대 중반쯤 되셨을까.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의 과장님은 항상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갑작스레 나오지 않아도, 매장에 사고가 생겨도 나무라지 않았던 과장님은 담배를 좋아했다. 얇은 담배를 피우던 과장님은 담배가 없으면 내 담배를 얻어 피우기도 했고, 어떤 날은 담배가 떨어졌다며 나를 데리고 나가 바깥바람을 쐬주기도 했다. 함께 걷는 동안 과장님은 집이 본래 경기 남부에 있는데 집에 못 간지 며칠이 되었다며 한탄도 하고, 자식들 얼굴을 제대로 못 본다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함께 싸울 이유
12년이 지난 2015년 5월 9일, ‘동학농민운동 121주년 신만민공동회’라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정읍으로 내려간 나는 우연히 김 과장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이동하던 중이었다. 12년 만의 만남이었던지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신기했다. 과장과 아르바이트로 만났던 관계가 ‘신만민공동회’ 참석자로 만난다는 사실이. 반가움을 담아 나는 과장님께 물었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과장님이 대답했다.
“나 세월호 유가족이여.”
우리는 서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김 과장님은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셨다. 나는 연락처도 묻지 못한 채 허탈하게 자리에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투쟁을 하다가 가끔씩 ‘유가족’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를 고유 명사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던 유가족들을 보면서, 경찰버스 위에 올라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의 적폐를 드러냈다고 말하고 다녔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세월호 싸움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나는 적폐와 떨어져 있는 줄 알았다. 진실을 인양하는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유가족들에게 경의와 믿음을 보냈지만 그들과 내가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유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라 말할 때 그 아이들이 내가 아는 사람의 아이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와의 만남이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순간, 참사와 적폐가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 참사가 내 주변에게도 덮쳐 올 수 있는 재난임을 새삼 느꼈다.
어버이날인 5월 8일, 유가족 한 분이 목숨을 끊으셨다고 한다. 쌍용자동차에서도 포스코에서도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진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들이 지금껏 뱉어왔던 말보다 더 무거운 의미임을 이제 알겠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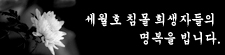


 '임금피크제'라는 덫
'임금피크제'라는 덫
 대한문의 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봄
대한문의 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