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_우수상] 어느 멋진 날
리우진 연극배우

나는 연극배우다. 반년 넘게 공연도 없고, 단역으로라도 불러 주는 촬영 일정도 없었다. 불안하고 우울한 나날이 지속되는 일상이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생각 끝에 얼마 전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후배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였다. 돼지 저금통을 따서 소줏값 몇 푼을 들고 후배를 만났다. 후배가 일했다는 건설 현장에 가서 나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곳은 머나먼 남쪽 지방이었다. 후배는 그곳에서 몇 개월간 먹고 자며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알아보기로 하고 그냥 서로 사는 이야기만 하다가 자리를 파했다. 헤어질 때쯤 후배가 말했다.
“아, 참, 형!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안전 교육 이수증을 먼저 따야 해요.”
이건 또 뭔가 싶어 후배에게 물었더니 설명을 해준다. 후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정보였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건설업 안전 보건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곳을 검색하고 찾아갔다. 오후에 4시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그 자리에서 발급받았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것 같아 괜스레 뿌듯했다. 집에 오는 길에 역시 인터넷으로 인력 사무소를 검색해봤다. 여러 군데가 나왔다. 그중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다른 곳에 해보았다.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요즘 일을 줄 수 없는 상황이란다. 다시 다른 곳에 해보았다. 없는 번호란다. 그렇게 몇 군데 전화해보는데 살짝 두려움이 스며든다. 나 같은 무경험자에게도 일을 줄까?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몇 시에 일을 나가서 몇 시에 일을 마치는 것일까?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내 코가 석 자.
이윽고 한 인력 사무소와 연결이 되었다. 집에서 지하철로 네 정거장 떨어진 데에 있는 곳이었다.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침 5시까지 사무실로 오란다. 엥? 지하철 첫차도 다니지 않는 시각인데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버스 타고 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하아, 그곳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야 말이지. 아무튼, 알았다고 하고 이런 일은 처음인데 뭘 준비해 가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안전화는 있냐고 묻는다. 안전화? 그게 뭐지? 신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군대에서 신던 전투화를 신고 갈 것이라고 했더니 펄쩍 뛰며 안된다고, 꼭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다른 준비물은 없냐고 물었다. 각반이랑 목장갑은 사무실에서도 판매하니까 내일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구매해도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기술이 있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기술 필요 없단다. 그냥 청소 정도 하면 된단다. 청소 정도야 뭐. 그래서 알았노라고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일단, 안전화를 사야 했다. 검색을 해보았다. 언젠가부터 건설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어디서 사야 하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며칠 걸릴 테고. 동네 시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신발 파는 곳을 찾았다. 신발 가게에 가서 혹시 안전화 있느냐고 물었더니 몇 개를 보여준다. 디자인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았다. 하긴, 지금 디자인이나 멋을 따질 때가 아니지. 얼마냐고 물었더니 6만 원. 깎아서 5만 5천 원에 안전화를 사서 집에 들어왔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5시까지 인력 사무소에 가려면 4시에는 일어나서 대충이라도 아침을 챙겨 먹고 가야 했다. 첫날이라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이었다. 모든 게 처음 맞닥뜨리는 일이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새벽 4시, 잠을 푹 자지 못해 약간은 멍한 상태에서 맞춰 놓은 알람 시각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반찬 두어 가지에 아침을 먹으려니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신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가신다.
“어디, 가니?”
“아, 네. 촬영이 있어서요.”
“어디로 가는데?”“가까워요.”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다. 생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데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다. 어머니는 촬영 잘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집을 나서서 새벽 기도를 가셨다. 괜히 코끝이 찡해진다. 낡은 가방에 수건과 티셔츠 한 장, 집에 있던 목장갑 한 켤레를 넣고, 역시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탔다. 새벽이라 그런지 인력 사무소에 5시 전에 도착했다. 택시비 4천 5백 원. 사무소에 들어가 어제 전화한 사람인데 일을 하러 왔다고 하니 앉아서 기다리란다. 조금 있으니 사람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와서 금세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사무소장이 나를 부른다. 연락처와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 일이 처음이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안전화는 준비했느냐, 각반은 준비했느냐 등을 물어보고 일당은 일 끝내고 사무실에 와서 받아도 되고, 원하면 계좌로 넣어줄 수도 있다고 한다. 일당은 일 끝내고 사무실에 와서 받겠다고 했다. 소개비 10%를 제하고 9만 9천 원이 일당이라고 한다. 각반을 2천 원 주고 샀고 혹시 몰라 목장갑 두 켤레를 천 원에 샀다. 전화를 계속하던 사무소장이 6시가 다 되어 갈 즈음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호명했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그렇게 일단의 사람들을 묶어서 어디 어디 현장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배정받았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들과 함께 가면 되었다. 7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인력 사무소를 나와 지하철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 다들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하긴, 새벽 일찍부터 나와 다들 피곤할 터인데 낯선 이들과 무슨 대화를 하겠는가. 나는 이날 어째서 지하철 첫차에 그렇게 많은 승객이 있는 건지 처음 알았다.
내가 간 곳은 대형 쇼핑몰을 리모델링 하는 건설 현장이었다. 서울에 올라온 시골 쥐마냥 아무것도 몰라서 어리둥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책임자 같은 분이 내가 소개받은 인력 사무소 상호를 대며 자기한테 오라고 하였다. 하여, 엉거주춤 그분한테 갔더니 “D에서 왔어?” 하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인력 사무소에서 온 사람들 몇몇과 함께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안전모를 나눠주고는 TBMtool box meeting에 참석하라고 한다. TBM은 일종의 조회이자 점호 같은 것. 그날의 작업 일정을 설명해주고,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안전모나 각반 착용 여부 등의 복장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TBM을 마치고 다시 창고로 가니 처음 나를 맞이했던 책임자가 그날 할 일을 배정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어느 구역 청소, 어떤 이들은 어느 구역 폐자재 나르기, 어떤 이들은 건축 자재 옮기기 등.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일을 맡아 자기 구역으로 가고 나서 혼자 남겨진 나에게 맡겨진 일은 건물 한 층의 좁은 배수구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진흙과 먼지와 쓰레기들과 자잘한 돌가루들이 뒤섞여 있는 배수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작업 지시였다. 차라리 잘됐다 싶었다. 그런 곳에서는 혼자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한갓질 것 같아서였다. 혼자서 그 넓은 층의 좁은 배수구와 그 주변을 청소하는데, 처음에는 그런대로 진도가 나갔다. 하지만 조금 있으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져 왔고 다리도 무척 아팠다.
한참을 작업했다 생각하고 시계를 보니 아직 30분도 지나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벌써 이러면 남은 하루를 어떻게 버틴다나? 쓰레기를 쓸고, 굳은 흙은 망치로 쪼아서 잘게 부수고, 그것을 다시 쓸어 모아 구간마다 마대에 넣어서 모아 놓는 일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진척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꾀를 피울 수가 없어 천천히 꾸역꾸역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작업하는 곳으로 그 책임자가 오더니 지금 하는 일은 놔두고 자기를 따라오란다. 그래서 갔더니 이번엔 폐자재 옮기는 일을 하란다. 가만 보니 현장에서 그때그때 먼저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각종 기술을 써서 작업하고 나면 폐자재들과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같은 잡부들이 그다음 공정이 수월할 수 있도록 뒤따라가며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날 하루만도 이것저것 시키는 일을 하느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길 수차례였다. 그런데 아무리 작업을 해도 점심시간은 너무나 더디 왔다. 하루가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것을 군대에 있을 때 말고 인생에서 두 번째 느껴보는 것 같았다.
드디어 점심시간, 다들 안전모를 제 위치에 벗어놓고 줄지어 밖으로 나간다. 나도 얼핏얼핏 눈치를 보며 따라 나갔다. 현장 주변에는 함바집도 있었고 여러 식당도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구내식당 밥을 좋아하므로 함바집에 가서 줄을 서서 밥을 먹었다. 밥값은 5천 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아귀아귀 먹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부랴부랴 현장에 와보니 사람들이 다들 스티로폼이나 합판 등을 깔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낮잠을 자는 것이다. 나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고에 있는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루가 정말 길고 길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에는 주차장 층으로 가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였다. 전전날 내린 비에 주차장 층이 물바다였다. 양수기를 돌리면서 그곳에 투입된 사람들이 커다랗고 네모진 플라스틱 삽으로 물을 퍼내는 작업이었다. 역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오전부터 흘린 땀으로 옷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도 다 젖어 있었다. 내 땀 냄새도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은 오전보다 의외로 빨리 지나갔다. 4시 30분이 되니 다들 슬슬 작업을 정리하고 작업 도구들을 챙겼다. 나도 눈치를 보며 내 일을 정리하고 작업 도구들을 챙겼다. 아침에 처음 갔던 창고에 가서 안전모를 반납하고 땀에 젖은 티셔츠와 수건을 가방에 넣고 여벌로 가져온 티셔츠로 갈아입고 작업 확인증에 그 책임자의 사인을 받고 현장을 나왔다. 그야말로 퇴근을 한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인력 사무소로 향했다. 여전히 허리는 끊어질 듯하고 다리도 뻐근하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충족감과 성취감에 마음이 뿌듯하다. 인력 사무소에 들어갔다. 확인증을 제출하니 소장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10만 원을 건넸다. 나는 천 원을 거슬러 주었다. 오늘 내가 땀 흘려 노동하여 번 당당한 일당이었다. 사무소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돈 계산을 해보았다. 안전화 5만 5천 원, 택시비가 4천 5백 원, 각반 2천 원, 목장갑이 천 원, 점심값이 5천 원, 그래서 지출은 6만 7,500원, 오늘 일당은 9만 9,000원. 나는 오늘 나의 몸으로, 나의 노동으로 3만 1,500원을 벌었다. 내일은, 또 모레는 이미 투자한 기본 인프라가 있으니 나의 수익은 더 늘 것이다. 매일매일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애를 쓰면 나의 어려운 한시절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을 타기 전 골목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웠다. 하얀 담배 연기가 하필 눈에 들어가서 눈꼬리가 살짝 젖어버렸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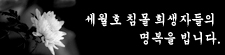


 [2020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_최우수상] 우리는 ‘똥 치우는 아...
[2020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_최우수상] 우리는 ‘똥 치우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