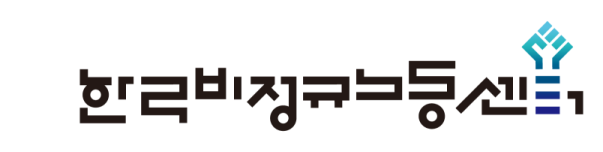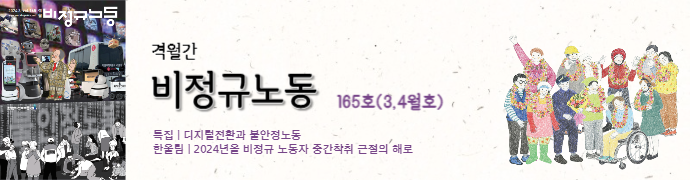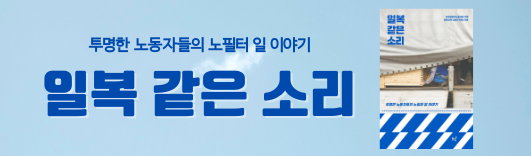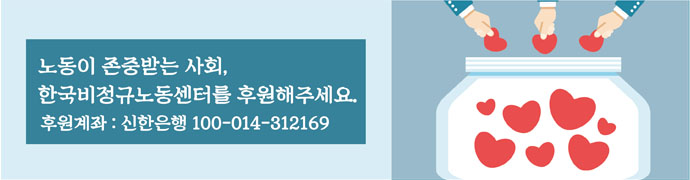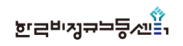글 수 112
글로벌스탠다드, 국제노동기준부터
최용(센터 정책연구위원)
노동권 글로벌스탠다드조차 지키지 않는 초라한 대한민국의 징표. ILO협약 비준율
ILO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노동기구로 통칭된다. 1919년에 출범한 ILO는 지금까지 189개의 협약과 201개의 권고를 국제노동기준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중 8개의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정해 회원국 정부의 비준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 모든 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1991년 UN산하 16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ILO에 가입했고 2016년 현재 189개 협약중 27개를, 8개 기본협약 중 4개를 비준하고 있다. 협약비준 수로는 미국(14개), 아이슬란드(24)개를 제외한 회원국 중 최하위, 핵심협약 비준율로는 ILO가입국중 하위 10%정도에 해당한다.
○ 미비준 핵심협약 ILO(183개국) 및 OECD회원국(34개국) 비준현황(2015년, ILO)
분야 | 협약명 | 비준국수 (비준율) | |
ILO | OECD | ||
결사의 자유 |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153(84%) 164(90%) | 31(91%) |
강제근로 금지 | ◦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 177(97%) 170(93%) | 30(88%) |
19년간 ILO이사국을 맡으면서도 기본협약에 대한 비준 진전 없는 대한민국
ILO이사회는 보면 28개국의 정부대표, 14명의 사용자그룹, 14명의 노동자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국제노동기구라기보다는 국제노사정 기구이다. 한국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 ILO 정부그룹의 이사국의 지위를 맡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제182호 가혹한 아동노동의 철폐 협약 비준 이후 핵심협약 비준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핵심협약 비준현황
분야 | 협약명 | 비준일 |
제100호 | ◦ 동등임금협약 | 1997.12 |
제111호 | ◦ 고용상 차별금지 협약 | 1998.12 |
제138호 | ◦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 1999.1 |
제182호 | ◦ 가혹안 아동노동의 철폐협약 | 2001.3 |
미비준협약중 87호,98호 협약은 노조결성의 자유, 단체교섭의 보장에 대한 내용
한국이 미비준한 협약 중 제87조와 98호는 노조결성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보장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이다. 미비준한 핵심협약에 대한 쟁점은 △공무원·교원노조의 노동3권보장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조결성권 보장(87호)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의한 소수노조 교섭권박탈(98호) 등이다. 제29호와 105호의 핵심쟁점은 △공익근무요원의 강제노동여부 △형법상 노역형등이고 비준하는 경우 법개정 및 정부의 행정지침에 대한 이행감시를 받게 된다.
○ ILO미비준 핵심협약의 주요쟁점 및 비준시 이행내역
협약 | 내용 | 주요쟁점 | 비준시 이행내역 |
87호 | ·결사의 자유 ·단체가입에 대한 차별금지 ·지배개입의 금지 ·연합단체·총연합단체 설립의 자유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는 결사의 자유 보호 | 공무원의 노조가입,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근로자, 사용자 단체의 행정기관에 의한 해산금지 위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 △교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조법 개정 △노조법 개정 |
98호 |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 ·자발적인 단체교섭의 추진 ·노사간 상호 불간섭 ·노사협상에 대한 법적 간섭사항 배제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의한 단체교섭 제약(*ILO 363차 보고서:전임자 임금지급 법적 간섭대상 아님 확인’) | △노조법 개정 |
틈만 나면 외치는 글로벌 스탠다드, ILO기본협약 비준부터 시작해야.
상황이 이런데도 19년간 ILO이사국을 맡고 있는 한국정부는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해 국내상황의 특수성,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회피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기간동안 고용유연화, 파견 확대등 재벌의 이익에는 글로벌스탠다드를 목놓아 외치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에는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나 노동계의 대응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면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ILO핵심협약에 대해 비준을 촉구한 의안은 2012년 당시 통합민주당 한정애의원의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골자로 한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결의안‘ 단 한 건 뿐이다. 노동계 역시도 현안이 생길 때 ILO에 제소는 하지만 정작 ILO기본협약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촉구하거나 총선, 대선 의제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형태노동자의 단결권 보장등 노동기본권 글로벌스탠다드를 위해 양대노총과 20대 국회가 미비준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또한 각 정당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의제로 미비준 ILO협약 비준을 공세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