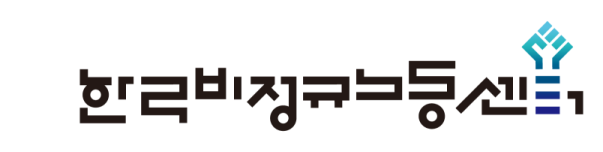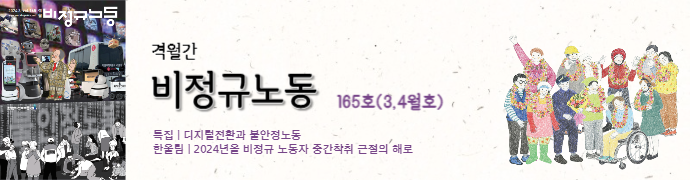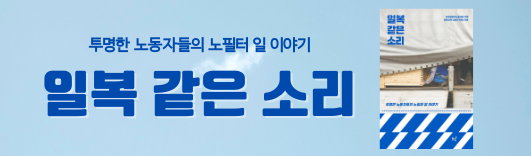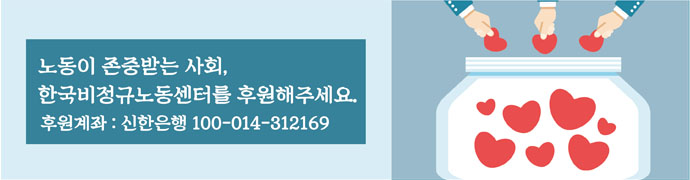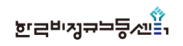글 수 2,143
언제까지 ‘블라블라’만 할 것인가
지난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마무리됐다. 2015년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기후위기를 돌이키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터라 획기적인 합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다. 탄소 배출 주범인 석탄 발전은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에 그쳤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선진국들은 기후기금 확대를 합의했으나, ‘지원’을 넘어 ‘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는커녕 2도를 넘길 거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COP26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다. 스웨덴 기후운동가 툰베리의 말처럼 ‘블라블라(blah blah)’가 난무했다. 아무리 거대한 정의를 외친다고 한들, 행동이 결여된 말은 공허하다. 차라리 부정의를 외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장 반대라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단테가 <신곡>에서 묘사한 가장 깊은 지옥은 9층인데, 위선자는 그 바로 위인 8층에 자리 잡고 있다. 기억할 만하다. ‘블라블라’는 사람들을 달콤한 희망에 취하게 한다. 거짓말임이 드러나면 새로운 ‘블라블라’가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행동하기를 멈춘다.
20대 대선 국면이 뜨겁다. 선거철은 ‘블라블라’의 계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유보한 바 있다.) 원내정당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즉답을 피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14년이 흘렀다. 그간 숱한 논의가 오고 갔다. 그리고 대선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 최적의 장이 아닌가. 각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함이 마땅하다.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 행동 없는 말에 불과하다. 어쩌면 ‘블라블라’를 ‘사회적 합의’로 번역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노동 의제는 ‘블라블라’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현재까지 나온 대선 노동공약은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주 4일제와 신노동법 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정도가 전부다. 대다수 국민은 노동으로 밥벌이를 한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5%가량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할 권리 확대, 불법파견 문제 해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다뤄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앞다퉈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노동을 외면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 캠프에 비정규직 노동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2017년 대선 때 보낸 질의서의 문항은 총 13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근로자 개념 확대, 간접고용 문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고용보험 확대 등)였다. 당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답해 왔다. 답변을 분석해 동그라미(긍정), 세모(중립), 가위표(부정)로 분류했다. 문재인 후보의 답변 중 11개는 동그라미, 2개는 세모였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을 앞둔 지금, 질의서 문항 중 개선된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 행동 없는 말뿐이었다. 이번 대선 질의서 역시 지난번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임금·자산·문화·지역·권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망국적인 불평등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후변화는 회복 불가능한 임계치에 다다랐다. 더 늦으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전시상태처럼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에게는 ‘블라블라’를 더 들어줄 여유가 없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ilecdw@naver.com)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COP26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다. 스웨덴 기후운동가 툰베리의 말처럼 ‘블라블라(blah blah)’가 난무했다. 아무리 거대한 정의를 외친다고 한들, 행동이 결여된 말은 공허하다. 차라리 부정의를 외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장 반대라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단테가 <신곡>에서 묘사한 가장 깊은 지옥은 9층인데, 위선자는 그 바로 위인 8층에 자리 잡고 있다. 기억할 만하다. ‘블라블라’는 사람들을 달콤한 희망에 취하게 한다. 거짓말임이 드러나면 새로운 ‘블라블라’가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행동하기를 멈춘다.
20대 대선 국면이 뜨겁다. 선거철은 ‘블라블라’의 계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유보한 바 있다.) 원내정당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즉답을 피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14년이 흘렀다. 그간 숱한 논의가 오고 갔다. 그리고 대선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 최적의 장이 아닌가. 각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함이 마땅하다.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 행동 없는 말에 불과하다. 어쩌면 ‘블라블라’를 ‘사회적 합의’로 번역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노동 의제는 ‘블라블라’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현재까지 나온 대선 노동공약은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주 4일제와 신노동법 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정도가 전부다. 대다수 국민은 노동으로 밥벌이를 한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5%가량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할 권리 확대, 불법파견 문제 해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다뤄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앞다퉈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노동을 외면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 캠프에 비정규직 노동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2017년 대선 때 보낸 질의서의 문항은 총 13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근로자 개념 확대, 간접고용 문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고용보험 확대 등)였다. 당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답해 왔다. 답변을 분석해 동그라미(긍정), 세모(중립), 가위표(부정)로 분류했다. 문재인 후보의 답변 중 11개는 동그라미, 2개는 세모였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을 앞둔 지금, 질의서 문항 중 개선된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 행동 없는 말뿐이었다. 이번 대선 질의서 역시 지난번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임금·자산·문화·지역·권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망국적인 불평등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후변화는 회복 불가능한 임계치에 다다랐다. 더 늦으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전시상태처럼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에게는 ‘블라블라’를 더 들어줄 여유가 없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ilecdw@naver.com)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