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반 타의 반으로 18번이 되어 버린 노래
김남수 밴드 ‘개차불스’ 기타리스트, 센터 전 기획편집위원
20년 가까이 되었다. 가을날이었던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때쯤 이미 몇 순배 돈 술잔들이 어지럽게 놓인 잔디밭 위에서 한 커플이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 들어보는 데다 창자들의 가창력도 딱히 좋지 않아서 기억에 남을 만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런데 참 묘했다. 민중가요라고 하면 질색을 하던 내가 그날 이후 시나브로 이 노래를 읊조리고 있었다.
파란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땀 냄새로 가득한 거리. 어느새 노을로 물들고, 가난의 풍경이 덮쳐 오고,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텅 비어 칠흑 같은 밤이 쓸쓸하게 내려앉은 청계천8가. 그럼에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외침으로써 가난과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으로 존재하는 노래.
지금은 민중가요의 틀에서 벗어나 드라마의 OST로 쓰일 정도로 대중적인 곡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운동권 사이에서 주로 불리던 노래였기 때문에 흔히들 〈청계천8가〉를 민중가요로 규정했다. 공교롭게도 이 노래의 주인공인 밴드 ‘천지인’은 민중가요에 록Rock의 양식을 들여왔다는 이유로 ‘미제의 음악’을 한다는 노골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고등학생 때부터 록 밴드를 해 온 내게는 그 점이 되레 친밀하게 다가왔다.
우연한 계기로 노래패에서 리드 기타를 맡게 되었다. 노래패라고는 하지만 밴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있었고, 나도 민중가요는 안 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들어간 터였다. 그런 내가 노래패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민중가요 〈청계천8가〉에 꽂혀 이 노래를 입대 전 마지막 공연 무대에 세우려고 변죽을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가창반 보컬들 중 〈청계천8가〉를 부르겠다는 이는 없었다. 결국 내가 기타 반주와 노래를 다 하게 되었다. 가창반 보컬이 노래를 부르면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를 얹어 웅장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는데, 내가 노래까지 해야 해서 통기타와 베이스, 드럼 3인조로 단출하게 무대에 오르는 수밖에 없었다. 나름 혼신의 힘을 다해 불렀고 박수와 함성 소리가 꽤 컸던 걸로 보아 망한 무대는 아니었다.
군 제대 후 복학해 보니 동아리는 밴드로 완전히 정체성을 탈바꿈한 상태였다. 〈청계천8가〉를 무대에 세웠던 건 한때의 추억으로 접어둔 채 선후배 불러 모아 하드록과 헤비메탈을 신나게 연주했다. 그래. 이게 나의 정체성이지 민중가요는 무슨. 그래도 〈청계천8가〉와 이따금 어울렸던 운동권들과의 인연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는지 졸업을 한 해 앞두고서였나. 갑자기 그럴싸한 민중가요 풍의 노래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 김남주 시인의 시 〈나의 꿈 나의 날개〉에 곡을 붙여 무대에 올린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무대에 〈청계천8가〉를 올린 적은 없다. 그렇게 〈청계천8가〉와 나의 인연은 다해가는가 싶었다.
사회에 발을 딛고 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다. 성향상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편에 가깝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무한한 자유를 갈망하고, 노동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터라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윗사람 눈치나 보며 야근 철야를 반복하는 일상을 보내는 건 아니다 싶었다. 때마침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직장 내 흐름도 정권 협조적으로 바뀌는 것을 목도한 터라 조금의 미련도 없이 퇴사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된 곳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였다.
학생운동 경험도 전무한 상황에서 노동운동 단체에 적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지’라는 호칭부터 어색한 마당에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았다. 그런 내/외면의 갈등을 완화해 준 건 술과 음악이었다. 술을 좋아해서 센터 식구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판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청계천8가〉가 재등장했다. 불콰하게 술기운이 돌면 으레껏 낡은 기타를 퉁기며 〈청계천8가〉를 불러제꼈고 어느새 〈청계천8가〉는 나의 18번이 되어 있었다. 〈청계천8가〉가 나의 유일한 민중가요 레퍼토리인 탓도 있겠지만 듣는 이들도 다른 노래들보다 〈청계천8가〉를 좋아해 들려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았던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술판의 빈도만큼 〈청계천8가〉를 부르는 빈도가 높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작자보다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다는 확신마저 들었다.

2018년 11월, 세종호텔노조 목요 집중집회 연대 공연
〈청계천8가〉는 술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이따금 크고 작은 행사나 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집회, 세종호텔노조 집회, 삼성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 단식 투쟁 문화제, 서로넷(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출범식, 서울일반노조 문화제 등에서 〈청계천8가〉가 소환되었다. 그 덕분에(?) 노래를 업으로 삼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제법 여기저기 불려 다녔다. 비교적 최근에 오른 무대는 2020년 여름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 투쟁 문화제였다. 이날은 낮술을 몇 잔 걸치고 술기운이 제법 오른 상태로 무대에 올랐다.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구라를 풀고도 싶었지만 본래 말재주가 없는 터라 술기운도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노래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청계천8가〉를 힘주어 불러제꼈다. 심취해 부르는 노래가 듣는 이들의 마음도 치길 바라면서. 20대 초반 처음 〈청계천8가〉를 무대에 세웠을 때와 비슷한 마음이었고 청자들의 반응도 그때의 데자뷔처럼 느껴졌던 걸 보면 역시 망한 무대는 아니었다.
〈청계천8가〉는 시나브로 다가와 시나브로 잊혀 가는 추억 속 노래로 그칠 수도 있었다. 오히려 그랬다면 이 노래에 대한 아련함과 애틋함이 더 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발을 들인 후 자의 반 타의 반 〈청계천8가〉는 내 18번이 되었고, 여전히 나와 내 주변에 살아 숨 쉬는 노래로 남아 있다. 가난의 풍경이 덮쳐 오고, 칠흑 같은 밤이 쓸쓸하게 내려앉는 거리는 ‘청계천8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도처에 있었고, 그 거리 위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외치는 이들 역시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이 노래가 그렇고 그런 추억 속 노래가 아닌 현역임을 증명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현재성을 증명하는 노래가 아닌 추억의 노래로 남기를 바란다. ‘비참한 우리’가 ‘가난한 사랑’을 위해서,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 할 세상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 〈청계천8가〉는 천지인의 록 밴드 정체성을 보여 주는 노래는 아니다. 록 밴드로서의 천지인을 알고 싶다면 〈언제나 여기에〉를 들어보시라.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록커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의 〈Bark at the Moon〉 뺨치는 리프와 솔로가 펼쳐진다. 두 음악을 비교하며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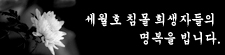


 앉아서만 부를 수 없었던 노래
앉아서만 부를 수 없었던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