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범 센터 기획편집위원
즐겨 부르거나 자주 부르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누군가 나에게 음치라고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고음을 좋아하지만 그 음에 맞게 부르지 못하는 나에게, 악보를 독해할 줄 모르는 나(처음 보는 노래 악보를 보며 흥얼거리는 이를 정말 부러워한다.)에게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물었다. 거기에 사연까지 덧붙이면 좋다고 했다. 4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뭔지 나에게 질문을 해봤다.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보면서 심지어 외우며 불렀던 노래는 바로 〈애국가〉다. 1~4절까지 쓰는 쪽지 시험은 음악 아니면 도덕 시간이었을 테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얼마나 국가 중심적인 가사인가. 엄청나다. 지리적으로 그 넓고 넓은 동해물이 마른다는 것과 가장 높은 백두산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닳을 시간이 될 때까지 하느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준다는 내용이다. 애국가는 텔레비전을 밤늦게까지 보거나 매우 일찍 틀게 될 때 들을 수밖에 없게 의무 편성이 되어 있다. 각종 국제 체육 대회와 국가 행사에서 애국심을 불태우는 노래다. 자동적으로 국가가 나오면 가슴에 오른손을 가져다 대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확인했던 때가 있었다. 지금 애국가를 4절까지 외우고 있을지 한 번 해봤는데 정말 알고 있어서 놀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주기적으로 교가를 배웠고, 매주 월요일 조회 시간 때마다 반복 학습을 해왔다. 때로는 담임 선생이 아이들이 교가를 외우는지 앞에 세워 혼자 부르게 하기도 했다. 한강, 관악산, 자랑찬, 우뚝 솟은, 정기, 착하고, 씩씩함 등 과도한 수사와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은 가사와 도덕적 의무감을 부과했던 노래다. 지금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매주 일요일 한 시간가량 걸어가야 했던 성당(당시 아침 만화 동산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했다.)에서는 성가대 노래와 오르간 반주와 함께 미사 노래를 따라 불렀다. 어떤 때는 졸다가 노랫소리에 깨기도 했고, 어떨 때는 노랫가락에 흠뻑 취하기도 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느님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과 같은 것이리라 생각하면서 불교 신자는 어쩌지 걱정하며 불자들은 “부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건 아닌지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사랑의 신비〉, 〈주님은 나의 목자〉 등은 지금도 부를 수 있다.
정규 교육을 가득 채우는 도덕적 교육 속에서 목가적인 노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돌아오라 소렌토로다. 사실 내가 처음으로 음악 시간에 칭찬을 들은 노래일 것이다. 그것도 한글로 원어 발음을 적어서 외워 불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래가 내 애창곡이 될 수 없다. 도대체 그 노래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소렌토로 돌아오든 말든. 딱 한 학기 동안 아주 열심히 불렀을 뿐이다.
그리고 온갖 눈총을 받으며, 심지어 맞기도 하고 관물대에 발을 올리는 얼차려를 하며 불렀던 노래도 있다. 악보도 없고 선임병先任兵의 음을 그대로 따라 해야 했다. 도대체 군가에 악보가 있는지 싶다. 악으로 깡으로 부르는 노래. 일단 소리는 커야 한다. 천당에서 지옥까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동을 하면서 부른 노래다. 암기 강요 금지를 중요시하면서도 꼭 외워야 했다. 일병을 단 선임병이 이등병 노란 표식까지 단 후임병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노래를 외우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도대체 까마귀냐 그걸 외우지 못하냐. 도대체 머리를 어디에 걸어뒀나! 엎어!! 제대하면 절대로 부르거나 듣거나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그 군가가 몇 해 전부터 광화문 한복판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제목도 무시무시한 멸공의 횃불이다. 나도 모르게 귀에 들리는 노래 가사를 외우고 있었다.
정말 좋아서 가사를 종이에 쓰거나 반복해 듣거나 한 적이 있을까? 대중가요의 서정성과 감미로운 팝송 중 몇 개를 외우거나 녹음해 들었던 경험이 있기는 하다. 그러다 문득 지난해 가을 한 모임의 회의에서 불렀던 노래가 떠올랐다. 민중가요라고 불렀던 노래다. 한밤중, 단풍이 들기 시작한 연수원 창밖에 반달이 걸려 있었고, 긴 토론을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부르기 시작한 노래. 민중가요의 힘은 함께 따라 부르게 하며 다음에 내가 뭘 부를지 생각하게 한다. 술자리, 집회에서 들렸고, 불렸던 노래다. 선동적이기도 하고 서정성이 강하기도 하다. 누군가는 팔뚝질이 없으면 부르지 못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록rock 요소를 가미한 노래를 주체 창법이라 했다.

1980년대 학생들은 학교 동아리방에서, 잔디밭에서, 광장에서 민중가요를 즐겨 부르곤 했다.
잔디밭에 둥글게 앉아 돌아가면서 민중가요를 불렀다. 누군가 감정을 울리는 노래를 했을 때 다음에 내가 부르리라 생각하며 그 노래 제목을 알아내고 외웠던 적이 있다. 〈희망의 노래〉, 〈직녀에게〉, 〈전화카드 한 장〉, 〈청계천 8가〉, 〈92년 장마, 종로에서〉, 〈철의 노동자〉 등 폭염이 한반도를 태웠을 시점에 내가 한창 불렀던 노래다. 노동가요 공식 음반이 나왔을 때다. 민주노총이 출범했을 때다.
“연인아 연인아~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며 감정을 끌어 올리거나 서로서로 비워진 잔을 채워가며 “너의 빈 잔에 술을 따라라!”하고 불렀던. 또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로 시작하는 〈전화카드 한 장〉은 그때 내 주위에서 자기가 먼저 부르려고 했던 노래 중 하나였다.
당시 동아리 한 선배는 기타를 치면서 민중가요 책 《희망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를 넘기기도 했다. 여기에 잠깐잠깐 구호를 곁들여 가면서 힘차게 또는 너무나 슬프게도 불렀다. 당시 내 기억 속에 〈노동의 새벽〉 중 “서른세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이란 대목은 너무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 분위기와 정서는 열악한 노동 계급의 처지와 조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취재 일을 했을 때 자조적으로 불렀던 노래도 있다. “다시는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탑골 공원을 지나면서 웬디스 햄버거 간판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한다. 명동 성당의 십자가가 보이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퇴근길 홀로 걷다가 문득 나직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다. “나의 삶은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한가. 오늘 밤 퇴근길 거리에서 되돌아본다. 이 세상에 태어나 노동자로 살아가며 한평생 떠나고 싶지 않은 동지들 앞에··· 마음이 고달플 때면 언제라도 웃음으로 나의 사랑과 믿음이 되는 동지들 앞에 나의 삶은 부끄럽지 않은지.”
내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는 뭐였을까? 나는, 당신은, 우리는 언제쯤 잔디밭에 모여 앉아 술잔을 나누며 함께 노래 부를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때 난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를 가득 채울 그 노래, 당신의 목소리. 가능성과 상상과 변화와 운동을 다짐할 수 있는 그 노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래.
《비정규노동》 독자 여러분 당신의 차례가 왔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제가 힘껏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아 술도 한잔 따라 드리거나 흥이 나면 춤을 출 수도 있답니다. “우리 해방의 술을 따라라!”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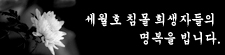


 ‘영영’ 잊지 못할 노동조합
‘영영’ 잊지 못할 노동조합